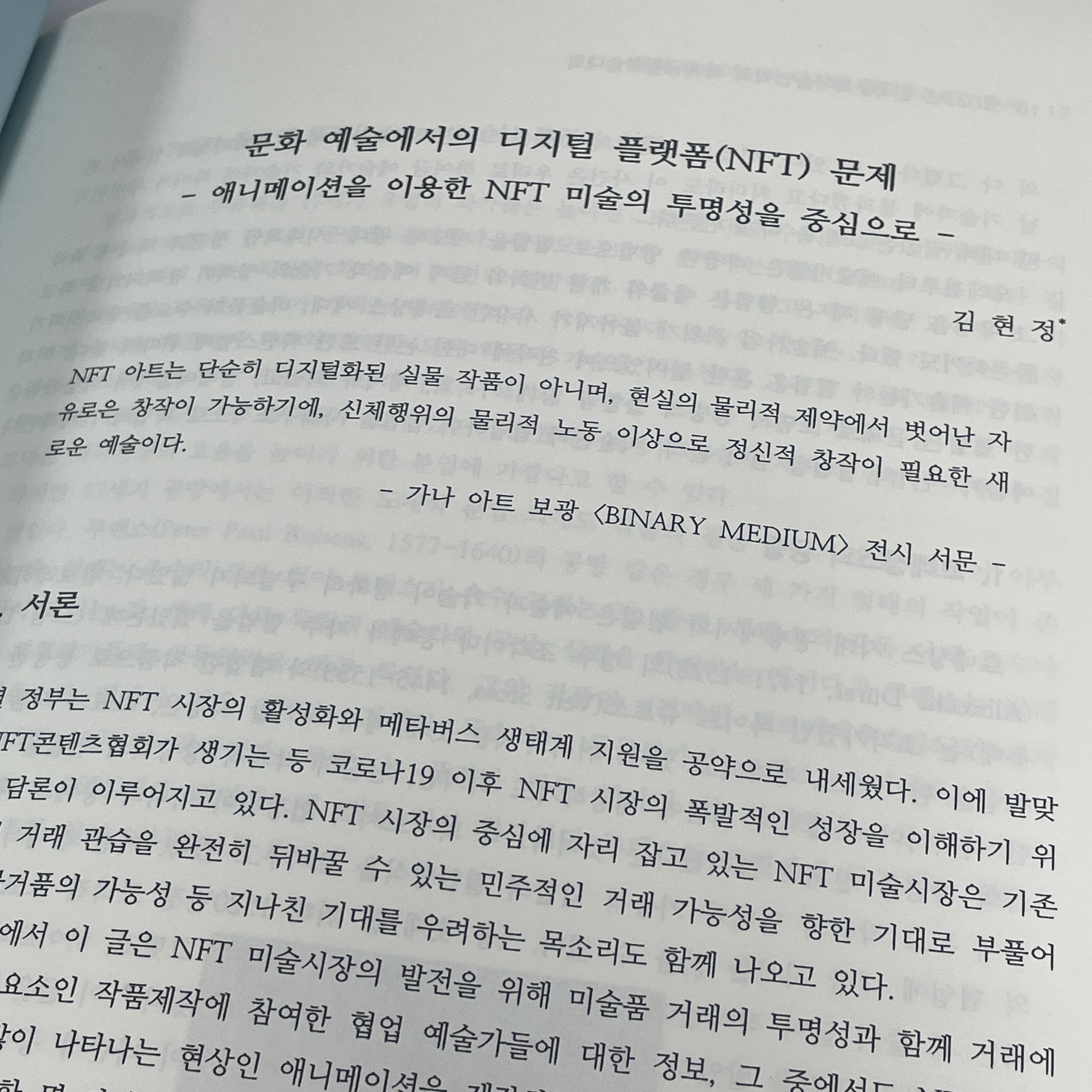
어제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NFT 미술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작년 NFT 미술이 한참 뜨거워질 시기 영상 작업을 하고 있는 친구에게 애니메이터로 한 갤러리 대표님과 일하는 걸 연결해준 적이 있었다. 마침 오늘 한국문화예술법학회 하계학술대회 학회지를 읽는데 관련 내용을 읽게 된 것이다.
친구는 대표님의 디렉션에 따라 애니메이팅 작업을 했고, 작업을 위해 작가와 직접 인터뷰를 했음에도 대표의 의견대로 작업이 진행되었다고 한다. NFT 발행을 위한 애니메이팅 작업은 자신이 다하고 있는데도 발행 시에는 작가 이름만 명시될 뿐 애니메이터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다. 판매 성과가 좋아 잘 마무리되긴 했지만, 자신이 NFT 미술 발행 자체에 기여한 비중이 크다 보니 작업 내내 NFT 미술의 발행에 있어 작업의 영역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다고 한다. 이는 NFT 미술이라는 형식 자체에 대한 의구심으로까지 이어졌다는 내용이었다.
사실 NFT 미술이라는 미디엄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협업에 있어 불투명한 분배와 등록이 자행되어 왔던 예술계 시스템에 대한 문제일테지만, 협업자를 지우는 현상이 NFT에서 역시 다시금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다.
필자 김현정의 글에서도 작품 제작 초기 기획부터 함께 작업하는 경우가 아니라 원본의 작업에 애니메이션을 부가하는 형태일 때 이와 같은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애니메이터의 이름과 명확한 계약 관계를 밝혀 저작권의 문제를 소명해야 한다. 더불어 추급권을 언급하며 협업 관계인 애니메이터까지 지속적으로 재판매 금액의 일정 비율을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이상적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모든 협업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게 당연하다는 인식이 자리잡으면 얼마나 좋을까) 결론에서 애니메이터 뿐만 아니라 사운드 분야도 언급하며 미술작품이 확장되어 가는 과정에 다양한 연계와 협업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이 자연스러운 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건전한 시스템 확립에 대한 중요성을 논하고 있다.
김현정은 미술사 내에서 예술가와 장인의 협업 시스템에 대한 역사를 살펴보며 그 근거를 다룬다. 도제 시스템에서는 제자를 기른다는 명목으로 스승의 그림을 대신 그리는 경우가 있기도 했지만, 화가와 공예가가 협업하여 그 공예품이 전시된 장소까지 도안에 명기해두는 사례도 있었다(그림1. 알브레히트 뒤러의 <용 촛대를 위한 소묘>와 바이트 슈토쓰의 <용 촛대 Dragon Chandelier> ,1522). 다만 관련 역사 뿐만 아니라 본 논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현 세태와 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들도 조사되었다면 보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제목이 디지털 플랫폼의 문제 및 투명성이라고만 명기되어 있어서 플랫폼 자체가 가지는 문제점에 대한 내용일 것이라 생각했다. 애니메이터와의 협업에 관련된 내용이라 개인적으로는 더 흥미롭긴 했지만 소제목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어도 좋았을 것 같다.
사실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개인의 이름이 지워지는 경험을 자주 하곤 한다. 그래서 업무 차 발행한 출간물의 경우 어떠한 작업도 하지 않은 대표의 이름만 발행인에 기재되는 것이 아니라, 실무자의 이름을 넣는 것을 제안하고 추진한 적이 있었다. 참여 비중이나 정확한 직무까지는 적을 수 없었고 팀원 모두의 이름을 기재하게 되긴 했지만, 그렇게라도 이름이 등재되어 조금이나마 뿌듯했다.
요즘에는 그래도 대안적인 예술, 실험적인 예술을 하는 그룹이나 작업자들의 경우 협업하는 모든 사람들의 크레딧을 정확하게 밝히는 추세인 것 같다. 인스타그램같은 SNS에 작업을 공개할 때는 참여자의 SNS아이디까지 모두 기재하여 각자의 역량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 그 링크를 통해 새로운 만남과 작업, 협업이 발생한다. 현재 진행 및 공개하는 작업을 통해 사실상 일종의 홍보와 PR을 함께 하는 것이다. 예술계에서는 (지원 또는 공모사업의 규정 상이든, 작업자의 사정 상이든)정당한 보수를 받고 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서로서로 지원하는 의미에서 이런 흐름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22.10.07
'미술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울리 지그 Uli Sigg 홍익대 특강 (0) | 2023.03.16 |
|---|---|
| 프로젝트 비아 - 시각예술 매개자 리서치 지원 사이트 (0) | 2022.11.17 |

